파격할인만 가득했다. 50% 할인, 3000원 균일가 판매 등 책을 싸게 파는 행사만 난무했다. 온라인 서점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얘기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출판사의 창고 대방출 같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에 비해 행사장 규모가 반으로 줄었는데 북아트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대부분이 사라졌고, 할인 행사는 온전히 남았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책 할인율 표시였다. 물론, 서울국제도서전의 인기는 여전했다. 매일 선착순으로 한정수량을 판매하는 민음사 캠페인박스 –만오천원에 판매하는데 삼만원 이상의 책이 담겨 있다. -를 사려는 사람들로 도서전 시작 시각 전부터 엄청나게 긴 줄이 만들어지는 광경이 펼쳐질 정도였다. 책이 주인공인 행사가 이토록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창고 대방출 행사, 출판사 합동 파격가 할인 행사가 아닌 ‘국제도서전’이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서울국제도서전의 표어는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꿈꾸는 미래’다. 표어만큼은 아주 거창하다. 하지만 도서전의 모습을 겹쳐 보면 책의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가 싶고, 자본의 논리에 예속된 세상을 보여주려는 의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여러 나라의 부스들도 ‘국제도서전’이라는 구색을 갖추려고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주빈국으로 선정된 오만도 별다를 바 없었다. 무료 헤나 체험만 인기가 많았다. 물론, 도서전에서 출판사와 책 구매자 모두 윈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출판사는 창고에 남은 책을 처리하고, 책 구매자는 저렴하게 책을 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굳이 ‘국제도서전’이란 이름으로 코엑스라는 큰 장소까지 빌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도서전이 아니더라도 책 할인 이벤트는 자주 열린다. 책을 싸게 사고파는 건 도서전이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도서전이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춰나가길 바란다. 책의 할인율보다는 책 자체가 주목받는 도서전이 돼야 한다. 책이 많이 팔리고 읽히는 것이 도서전이 가져오는 효과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대놓고 책만 파는 행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전인 건 영 민망하다. 책이 많이 팔리는 건 도서전의 부수적인 효과여야 한다.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다 도서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 선정도 꼭 쓸데없는 건 아니다. 도서전 현장 전체를 주빈국의 분위기에 맞춰 디자인한다든가, 주빈국 관련 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국제도서전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다.
도서전을 찾는 사람들은 나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테다. 도서전을 구경 가는 사람이건, 출판 관계자건 간에 말이다. 관심 있는 책을 저렴하게 파는 게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책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도서전 문화를 서서히 바꿔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종이와 잉크값만 따져봤을 땐 책값이 다소 비싸 보일지 모르지만, 책을 만들기 위한 저자와 출판사의 노력까지 고려한다면 책값이 결코 싸다고만은 할 수 없다. 도리어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릇 도서전이라면 책의 가치를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도서전이 책의 가치를 높이거나, 적어도 전달하지는 못할망정 파격 할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20대의 시선 > 데일리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데일리칼럼] 그리고 청년은 없었다 (0) | 2014.07.09 |
|---|---|
| 원자력과 자동차,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0) | 2014.07.08 |
| [데일리칼럼] 치열한 여름방학, 여전한 열정노동 (0) | 2014.07.04 |
| 전지현-김수현 생수광고 논란에서 한류스타란? (1) | 2014.07.03 |
| 연세대에 '카스트'는 실재하는가? - 또 하나의 20대 개새끼론 (17) | 2014.07.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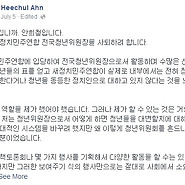



댓글